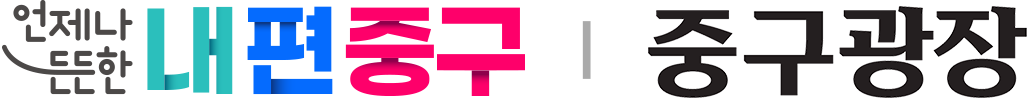쌍림동은 충무초등학교와 앰버서더호텔 맞은편인데 마을 입구에 초소를 세워 도적을 막던 이문(里門)이 쌍으로 둘이 있어 유래한 동명이다. 이문은 고대 때 자연적으로 생겨나 조선 초 동네 정문 역할을 위해 입구에 세워져 방범초소 역할을 했다.

세조 11년(1465)에 이문 설치를 명했고 기준 또한 엄격하여 가구 수가 20호 이하는 3인, 30호 이하는 4인을 동원해 교대로 순찰케 하고 순관과 병조가 감독하게 했다. 이문과 가까운 곳의 경수소(警守所)는 폐지하였는데, 이문이 지금의 자율방범 초소라면, 경수소는 국가 차원의 도적 예방을 임무로 하는 지구대나 파출소 격이었다.
경수소는 도성 안팎 도적 방비와 화재 예방 등 한성부의 치안 담당 일선 기관으로 조선 초에 설치되었고 야간엔 좌우순청 순라군이 거처하였다. 세종 18년(1436) 도성 안팎 경수소를 정비하여 특히 위험한 곳의 13개만 남겼고 세조 때는 도성 안에 87개소, 도성 밖에 19개소 등 모두 106개소가 있었다. 경수소에는 순라군 2명이 마을 방범대원 5명과 칼·창·활로 무장 후 교대로 숙직근무를 하였다. 조선 후기 도성 안팎의 순찰을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의 3군 문과 좌우 포도청이 책임졌는데 포도청은 좌우순청 밑에 경수소를 두어 책임 구역을 순찰하게 하였다.
이문은 조선 초 활발하게 운영되다가 근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차츰 부실해졌고 성종의 노력으로 재개되었으나 연산군 이후는 존재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문은 임진왜란 때 거의 소실되었고 기능도 상실했다. 영·정조 때 다시 기록이 나타나지만 이후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결국 조선이 쇠락해 가며 올바로 운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문은 쌍림동 외에 이문동 쌍문동처럼 동명으로 흔적이 남아 말없이 그 존재를 후세에 전하고 있다. 중구에서는 광희동주민센터 앞 쌍림어린이공원과 일부 문패 간판 등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3월엔 우리 동네 안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방범대원들께 차 한잔 대접해 보자.
김성섭(수필가)